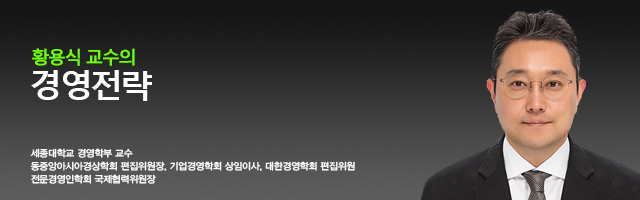기업 경영에 있어서 외교문제가 끼게 되면 해법이 복잡해진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몇 년 간, 한중관계는 사드 사태 이후에 부침(浮沈)을 거듭해 왔지만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 정부의 중국과의 외교, 경제 모든 측면에서 ‘디커플링(decoupling)’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디커플링은 우리 말로 해석하면 ‘탈동조화’인데, 세계 경제로부터 중국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처음 가시화됐다. 중국의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경제 전략인데 쉽게 말해서 ‘중국 길들이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과 모든 영역에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 편에 줄을 서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지난 몇 년 간 전개되어 왔다. 물론 우리 정권의 논리에 따라 더 가까운 쪽을 선택했던 이력도 있고, 2023년 6월, 현 상황에서는 중국 대사가 초치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외교에서 ‘균형 감각’은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된다. 어느 한 쪽 편에 기울이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때로는 주요하게 먹힐 때가 있다. 하지만 작금의 디커플링 상황에서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입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즉 어느 한편에 속하지 않게 되면 ‘국제 미아’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쪽에 연대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나서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혹자는 최근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베팅’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악로(惡路)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서의 저조한 실적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됐었다.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는 2016년까지 중국에서 178만대의 매출 실적이 있었으나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서 2022년에는 34만대로 곤두박질쳤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 SM, YG, JYP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미국과 유럽 등의 시장을 개척했다. 중국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16년 전체 영업이익이 8500억원이었으나 지난 해 영업이익은 4분의 1토막 난 21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아마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경종을 일찌감치 울렸던 우리 유통업계는 이미 디커플링이 완료된 상태다. 1994년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는 120개의 매장을 다 철수하고 지금 청두점 하나만 남겨두고 있고, 신세계도 이마타 사업장을 2017년에 모두 철수했다.
전략경영과 국제경영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미 10여년 전 한 논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탈(脫)중국’ 전략을 제시했고 당시 생소했던 ‘제3국행’ 전략도 제안했다. 대안 국가로는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의 저임금, 숙련 근로자들을 보유한 국가들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은 현실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로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필자가 제시한 ‘리로케이션(relocation)’ 전략을 실행 중이며, 2017년에는 베트남 현지기업과의 합작 생산 법인 진출,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기지를 만드는 결정을, 그리고 2020년에는 싱가포르에 그룹 최초로 자동차 생산과 R&D 연구 등을 함께하는 ‘글로벌 혁신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즉, 중국의 불확실성 증대와, 외교 갈등 등으로 버물어진 ‘차이나 리스크’가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중국 뿐만이 아니라 경영전략에 있어서 한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다양한 지역 포트폴리오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전략적 요충지이며 인접 국가이자 여전히 우리에겐 잠재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 시장이라는 카드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다. 작년 중국의 신차 판매량은 2686만대로 전 세계 판매량인 8000만대의 4분의 1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의 전기차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해 중국에서 팔린 4대 중 1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내연기관 차 판매량을 앞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물론 중국 국내산 판매 비중이 높겠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의 고급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도 높다. 전세계 명품시장의 큰 손이 중국 소비자인 것처럼, 우리 기업이 전기차에 대한 고급화 전략을 펼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이와 맞물려 현대차와 기아는 EV5, EV6, 대형 SUV인 EV9까지 고성능 제품 라인업이 있기에 충분히 중국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인식된다.
정리를 하자면 생산기지로의 중국,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방식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여전히 시장으로의 가치와 규모는 높고 크기에, 조용한 ‘스텔스 전략’ 방식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스며들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사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크게 열 낼 필요도 없고 감정이 앞설 필요도 없다. 외교와 경영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중국과의 디커플링 시대가 종결된다면 지금부터 우리 기업은 ‘리커플링(recoupling)’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짤 때다. 그것이 무모한 ‘베팅’이 될지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