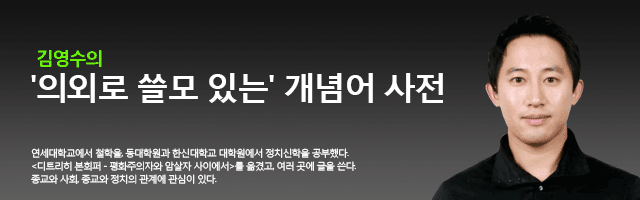동물(動物)
: 생물계(生物界)를 식물(植物)과 함께 둘로 구분(區分)한 생물(生物)의 하나. 길짐승‧날짐승‧물고기‧벌레‧사람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목살, 등심, 삼겹살, 사태, 알겠어? 이번에 가면 이렇게 돼는겨. 그게 이놈이 타고난 팔자여, 팔자.” 영화 <옥자>에서 옥자는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슈퍼돼지’다. 저 대사처럼 그는 곧 미국의 공장으로 이송돼 도축될 팔자다. 두매산골에서 서울을 거쳐 뉴욕 인근의 도축 공장까지, 마치 영화 <괴물>에서 괴물에게 잡혀 간 현서를 구하기 위해 한강 다리 밑을 뒤지며 악전고투한 가족들처럼, 미자 역시 옥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2011년 3월 17일 미국의 아이오와주 하원은 ‘HF589’라는 명칭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화된 도축장을 허가 없이 접근하거나 녹음 혹은 촬영하는 일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육식제국>을 쓴 미국의 정치학자 티머시 패키릿은 미국 사회는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대대적인 가축 학살을 은폐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그게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옥자>는 도축장의 높은 벽과 여러 법적 조치에 의해 가려진 하나의 사실을 스크린 위에 재현해놓는다.
사실 인류 문명의 여명기로 돌아가면, 동물은 신성한 자연의 일부이자 인간의 친족과 같은 존재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황소를 도살해하는 제의에 반대했고, 피타고라스는 정의의 원칙이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채식주의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태도가 확산되는데, 이성의 유무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엄격하게 가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성서에 따르면 신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다. 인간을 여타 생명의 지배자로 인준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시대를 지나 근대 초입으로 오면, 데카르트에 의해 동물은 인간보다는 차라리 사물에 가까운 움직이는 기계로 규정된다. 그전까지 동물에 대한 잔학 행위는 사회적인 금기였다. 하지만 기계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실제로 데카르트 시대에는 살아 있는 동물의 ‘생체 해부’를 참관하는 게 교양인의 필수 코스였다. 현대의 기업형 도축장은 데카르트적 세계관의 귀결이다.
하지만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동일한 차원에서 ‘종차별’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존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일이 정당한가” 묻는다. 남성과 백인인 그 자체로 비남성과 비백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잘못이라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특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잘못이며, “종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동물에게는 이성이나 언어 등 인간적인 특성이 없지 않나? 침팬지나 보노보 등의 대형 유인원 중에는 언어 학습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갓난아기처럼 그 ‘인간적인 특성’을 결여한 인간도 있다.
전문가들은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한다. 흔한 오해와 달리 채식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다. 고기를 먹을 때의 가장 큰 효용은 건강이 아니라 고기 맛에서 느끼는 쾌감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육식은 그를 통해 얻어지는 쾌락이 그 때문에 유발되는 고통보다 커야 정당화될 수 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느끼는 쾌락이 공장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는 돼지가 받는 고통보다 클까? <옥자>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참고할 만한 영화다.
티머시 패키릿은 “정치적 변화는 무언가를 ‘볼’ 때 일어난다”고 말했다. <옥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해도 좋을까? 영화는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난다.
하지만 몽상가들처럼 그려지는 동물해방가들보다는 거대 기업에 황금 돼지를 주고 옥자를 ‘구입’한 미자에 영화가 더 밀착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미자는 그 긴 여행을 겪고 깊은 교감을 나눈 뒤에도 왜 동물해방전선(ALF)의 회원이 되지 않은 것일까? 미자를 탓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견뎌내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지나치게 빨리 개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버리는 우리의 어떤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