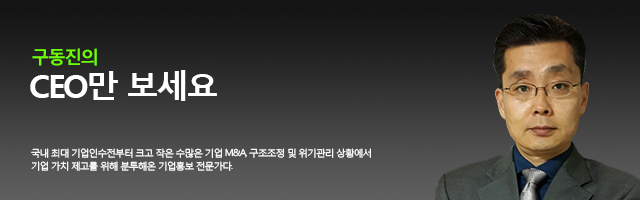1972년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대부’가 나왔다. 영화 역사상 1편과 속편이 모두 작품상을 받으며 전편보다 나은 속편이 없다는 속설을 뒤집은 몇 안 되는 걸작이다. 열연한 배우들도 그 면면이 입이 쩍 벌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화면 그리고 영화전체를 꿰뚫고 있는 스토리는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다. 명 대사가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역대 미국 영화 명대사 2위에 올랐던, ‘절대 거절 못할 제안을 하지’와 ‘친구는 가까이,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은 너무 유명하다.
‘Keep close your friend, keep your enemy closer.’
돈 비토 코르레오네(말론 브란드 분)가 막내 아들인 마이클 코르네오네(알 파치노 분)에게 해주는 충고다. 그리고 속편에서 다시 마이클 코르네오네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교훈을 아들에게 들려준다.
“There are many things my father taught me here in this room. He taught me.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하라
‘친구는 가까이 하지만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의 원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넬슨 만델라다. 그는 적대적이면서도 배타적이었던 남아공 백인들의 언어를 배웠다. 배울 당시만 해도 동족들로부터 숱한 의심과 모함을 받았다. 하지만 소위 그들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있는 시각의 내면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기에 이른다. 이해와 수용이 소통과 화합의 출발임을 실천으로 보여줬다.
나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 오면서 철 없이 날뛰던 전반 10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후반 10년은 이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라’는 격언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회사는 재무적인 위기가 산적했고, 하루도 부담스런 기사가 뜨지 않는 날이 없었다. 기사를 보고 난 이후에야 (사실 이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부랴부랴 신문사로 달려가곤 했다. 그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것일까?’하고 원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기업들의 경제 문제에 민감한 몇몇 경제신문사들은 거의 매일 편집국을 드나들었다. 그땐 회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기자들은 친구처럼 보였고, 꼬집는 기사로 회사에 시련을 주는 기자들은 설득시켜야 하는 적(?)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적이 될 수도 없고, 적이라 생각할 것도 없지만 분명 부담은 컸다. 하루도 그런 부담을 떨쳐버린 적이 없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기사를 쓸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혼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회사를 심히 꼬집는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는 기사를 쓴 기자나 데스크와 접촉도 쉽지 않았다. 연락을 취하고 찾아 가는 것도 부담이지만, 기사가 나가는 족족 찾아가 귀찮게 하는 나도 부담스런 존재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만 매번 부딪히자니 부자연스럽고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방법을 바꾸었다. 기사를 쓰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찾아 가던 것을 틈날 때마다 미리 찾아갔다. 처음엔 내가 편집국에 들어서는 것만 보고도 인상이 굳어졌던 기자들이 어느 정도 지난 뒤부터는 대하는 얼굴 표정부터 달라졌다. 가끔은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들고 가기도 했다. 들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부 연락을 수시로 했다. ‘근처에 왔다가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차 한잔 하자'고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만나고 연락했다.
담당 기자는 자주 만났지만, 담당이 아닌 증권, 금융, 시장을 커버하는 기자들은 누가 누구 인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명 한 명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그 바닥에서 안면 없는 기자들이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조금 과장하자면 모르는 기자가 없을 정도였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구 팀장 모르는 기자는 일하지 않는 기자'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 만남 덕분에 웬만한 기자들의 관심사는 꿰뚫게 되었다. 십 수년 이상 반복된 ‘부담스런 기자들과 더 가까운 생활'은 커뮤니케이션 대응을 훨씬 노련하게 만들어 주었다.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자들과 협의 할 수 있었고, 사전에 조치를 하거나 하는 대응도 가능했다. 하지만 회사가 부담 요인을 털어버린 것은 아니었기에 한시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협상의 법칙>의 저자로 유명한 협상전문가인 허브 코헨은 ‘코 앞에 닥쳐야만 정보를 찾는 방식으로는 참담한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평소 첩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상대를 위해 일하는 사람, 거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비서, 점원, 기술공, 수위 등이 모두 정보 획득의 원천이 된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나 입찰을 앞두고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평소 미리미리 발 품을 팔아 입수한 라이벌에 대한 정보다.
커뮤니케이터로 경험이 쌓이면서 체득하게 된 것이 바로 허브 코헨의 논리다.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치고 들어올만한 구멍을 잘 살피는 한편 이런 이슈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질 기자들과는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반응을 본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줄였다.
덜 친하고 대하기 힘든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라
주위 커뮤니케이션 담당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하기가 힘들기로 유명한 기자들 대부분은 ‘무섭게 대해서 연락하기가 부담된다,’ ‘깐깐하고 말이 잘 통하지도 않는다’거나 ‘다른 기자 올 때까지 포기 상태’라고 토로한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 한 두 번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반응이다. 때문에 그 이후로 연락도 잘 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만나기에 부담스런 사람들을 무슨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만나는 것은 더욱 곤욕스럽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친한 기자들보다 더 자주 만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친한 기자들은 자주 보고, 덜 친한 기자들은 더 자주 보라’고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 한다. 평소에 부담스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두고 자연스레 만날 기회를 만들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바로 큰 우환 거리를 덜게 되는 지름길이다. 약간의 뻔뻔스러움과 용기를 가지고 막 들이대는 것이 방법이다.
친구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 하자면,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 하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 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사실 내 곁의 누군가가 진정한 친구여서 같이 버스에 오르기를 바라기 이전에 나 자신이 친구의 고장 난 리무진에서 내려 같이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첫 만남에서 이런 관계는 힘들다. 그리고 매번 처리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만날 경우에도 오롯이 사람에게 집중하기란 쉽지 않다. 커뮤니케이터로서 제대로 된 만남은 평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관계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사람에서 출발하지 않는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내가 되었든 그가 되었든 리무진을 타고 있으면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야 리무진이 고장 났을 때 함께 고생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된다. 신뢰가 굳어지면 개인사든 회사 일이든 부담스런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보다는 수고로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해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1. 호랑이를 잡기 위해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놀아도 그들의 세계에서 놀아라.
2. 친한 기자는 자주 만나고, 덜 친한 기자는 더 자주 만나라.
3. 그들이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평소에 어필하라.